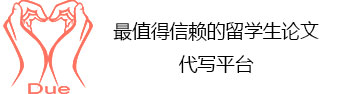服务承诺
 资金托管
资金托管
 原创保证
原创保证
 实力保障
实力保障
 24小时客服
24小时客服
 使命必达
使命必达
51Due提供Essay,Paper,Report,Assignment等学科作业的代写与辅导,同时涵盖Personal Statement,转学申请等留学文书代写。
 51Due将让你达成学业目标
51Due将让你达成学业目标 51Due将让你达成学业目标
51Due将让你达成学业目标 51Due将让你达成学业目标
51Due将让你达成学业目标 51Due将让你达成学业目标
51Due将让你达成学业目标私人订制你的未来职场 世界名企,高端行业岗位等 在新的起点上实现更高水平的发展
 积累工作经验
积累工作经验 多元化文化交流
多元化文化交流 专业实操技能
专业实操技能 建立人际资源圈
建立人际资源圈Esasy
2013-11-13 来源: 类别: 更多范文
경제공황의 개념과 미국의 경제공황 발생에 따른 뉴딜정책의 출현 및 뉴딜정책의 영향 분석
Ⅰ. 들어가며
뉴딜농업정책은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상당한 성과도 있어 공황극복과 경제회복 그리고 농업개혁정책 전환에 기여한 바 적지 않다. 그러나 실험주의적 입장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정책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시행착오와 미흡한 점이 적이 않았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뉴딜농업통제의 방향은 근본적으로 옳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 후 결함을 수정 보완하여 미국의 항구적인 농업정책으로 발전시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뉴딜산업정책이 지니는 경제사적인 의의를 살펴볼 때 당초에 기대했던 만큼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미국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정부가 이를 방관하지 않고 그것을 구출하려 노력하였고, 혁신주의시대의 경험을 계승하면서 자유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대폭 수정하여 산업에 대한 통제적 경제정책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뉴딜노동정책의 근본정신은 노자간의 단체교섭권과 균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과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부와 소득의 부당한 집중을 방지하며 비인간적·비민주적 현상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2차 뉴딜기에 들어와서는 기본적 항구적인 중요한 국가경제정책으로 취급되었던 것이며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사회로 종전보다 훨씬 안정되고 건전한 복지국가로 발전하여 전국민적 요망을 충족하게 되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흑인들의 표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가는 전환점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뉴딜정책은 산업·농업·노동·금융·사회보장·공공사업 분야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 분야마다 정책목적이 각각 다르지만 이를 종합해 보면 산업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를 민주화하려는 것,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의 결실을 보다 공평하게 분배하고, 자본주의의 악폐를 억제하려는 시도였으며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가 없이 광범위한 번영을 증진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Ⅱ. 경제공황의 개념
현상적으로는 신용거래의 붕괴 및 이와 관련한 상품판매의 불황, 그에 수반되는 재생산의 수축과 대량의 실업사태 등을 포함하는 자본주의 경제 특유의 현상을 일컫는다. 공황이란 자본주의적 생산에 내재하는 근본적 모순의 순간적·폭력적 폭발이며, 종종 전체 자본주의 체제를 심각하게 동요시키고 이를 파탄으로 몰고 갈 정도의 위력을 떨친다. 공황은 그것이 발생하는 경제부문에 따라 농업공황·금융공황·거래소(증권)공황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계기가 되어 발생하는 일반적 과잉생산공황, 즉 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의 균형이 전반적으로, 또한 급격히 파괴되는 현상이 가장 일반적인 공황이다. 과잉생산공황이 발생하면상품의 판매악화, 체화(滯貨)격증, 투매(投賣)속출, 물가폭락, 생산격감, 기업의 도산(倒産), 공장폐쇄, 신용의 붕괴, 어음·수표의 부도(不渡) 증대, 금리폭등, 주가폭락, 은행예금의 인출 쇄도 등 외에, 임금인하·해고·실업자 증대·노동조건의 악화, 이에 따른 폭동·자살의 증대, 정치불안 등으로 심각한 사회불안이 야기된다. 이러한 현상은 약 10년을 주기로 하여 정기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공황을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케인지언과 머니터리즘의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우선 케인지언(Keynesian)의 주장을 살펴보면, 설비투자·주택투자·내구성 소비재의 수요 등 민간부문 지출의 불안전성을 강조하고, J.M.케인스는 공황의 원인을 유효수요(有效需要)의 부족에 두는 이론체계를 《고용 ·이자 및 화폐에 대한 일반이론》(1936)을 통해 발표하였다. 그는 이 이론에서,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대량 실업문제를 감세를 위한 정부지출의 확대(재정정책)와 통화공급의 증대(금융정책)로 해결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전의 고전파경제학에서는 실업의 발생원인을 노동생산성에 비해 실질임금이 높은 데 두었다. 다음으로 머니터리즘의 주장:연방준비제도에 의한 통화정책의 실패를 중시하고 불황 원인을 연방정부가 통화공급량을 지나치게 삭감한 데 두었다. 대공황은 첫째, 세계경제 전체를 휘말리게 한 역사상 가장 격심한 사건이고, 둘째, 케인스 경제학을 생성시켜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경제정책의 틀을 크게 지배하게 한 사건이며, 셋째, 경제적으로는 블록화(블록경제)를 초래, 자유무역체제를 분단시켰고, 정치적으로는 독일·이탈리아·일본 등에 파시즘을 낳게 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된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데 특징이 있다. 케인스 경제학은 전후 1950~1960년대에 선진국에게 비교적 안정된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시켜 거의 완전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으나 1970년대에 이르러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서 그의 이론은 비판을 받고 1980년대부터는 많은 나라가 케인스정책 채용을 기피하였다. 그리고 세계경제의 블록화는 무역을 통한 세계 자원의 분배를 왜곡, 경제효율을 현저히 저하시킴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길을 열어 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Ⅲ. 미국의 경제공황 발생
1929년 10월 24일, 1920년대 미국, 주식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기만 했다. 28년 겨울에는 거의 모든 주식이 2배, 3배로 올랐다. 29년 10월 중순까지도 유명한 경제학자 Irving Fisher는 "주가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그 번영은 균형을 잃은 것이었다. 농촌은 불황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실업률은 점증하고 있었다. 드디어 24일 주가는 바닥으로 치달렸다. 신문은 다음날 이렇게 보도했다. "월가의어느벽이나모두비탄에잠긴투자가들의눈물로적셔졌다.” 주가가 폭락하자 뉴욕 월가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1929년 10월 24일 뉴욕월가 '뉴욕주식거래소'. 오전장세는 평온하게 시작됐다. 미국인 투자자 150만명은 지난 9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그 날도 주가가 상승곡선을 그릴 것을 의심치 않았다. 오전11시, 이상한 징후가 감지됐다. 매도주문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다. 며칠 전부터 묘한 조짐을 느꼈던 거래인들은 일손을 놓고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이들은 누구랄것없이 소리지르기 시작했다. "팔아. 빨리 팔아. 얼마라도 좋다. 팔기만 하면 된다." 증권시세표시기가 거래상황을 쫓지못했으므로 겁에 질린 투자가들은 자신들의 불운조차 알길이 없었다. '주가폭락'은 전 세계에 타전됐고 눈밝은 사람들은 다가올대공황의 기미를 알아차렸다 ‘암흑의 목요일'은 그렇게 시작되어 이후 10년간 세계경제를 '지배'했다.
1930년 12월 11일, 뉴욕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은행이 파산하면서 50만명이 예금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31년 한해동안은 은행 약 2300개가 문을 닫았다. 재고과잉상태에 빠진 제조업체들은 공장문을 닫기 시작했다. 34년까지 실업률은 25%에 달했고, GNP는30%나 떨어졌다. 미국의 불황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미국이라는 생사수출시장을 잃었고, 중남미는 미국의 차관철회로 경제계획을 포기해야 했으며, 금융공황여파로 독일은 600만명, 영국은 300만명의 실업자가 생겨났다. '일자리를 찾는다'고 적은 간판을 목에 걸고서있는 남자들, 굶주림에 지쳐 쓰레기통을 뒤지는 주부들, 실업자들 시위행진 등은 도시의 일상적 풍경이었다. 한편 농촌에서는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곡물이 밭에서 그대로 썩어갔다.
1920년대의 번영은 눈부신 것이었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은 돈버는데 관심을 쏟았다. 공화당의 기업지원책에 힘입어 제조업 생산량은 10년간 64%나 늘어났다. 디트로이트 자동차공장 에서는 17초마다 승용차 1대씩 굴러 나왔다. 미국인 5명당 1대꼴로 자동차를 가지면서 교외거주자들이 늘어나 건설업이 폭발적 호황을 맞았다. 화려한 고층건물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꾸었고, 산간벽지까지 보급된 라디오에서는 상품선전이 흘러나왔다. 근검절약이 경시되고 과시적소비가 미덕이 되었다.
23년부터 29년사이 기업이윤은 62%나 늘었지만 노동자 실질소득은 11%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구매력을 잃게 되자 창고에는 재고품이 쌓였다. 만성적 과잉생산현상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상황을 알아채지 못했다. 29년 Hoover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빈곤에 대한 최후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자신있게 외쳤다. 경제학자를 포함한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 대공황은 스타 두 사람을 탄생시켰다. 경제학자 John Maynard Keynes와 Franklin Roosevelt. Fascism은 공황이 낳은 패륜아였다. 1929년의 대공황(Depression of 1929) 또는 1929년의 슬럼프(Slump of 1929)라고도 한다. 1929년 10월 24일 뉴욕 월가(街)의 ‘뉴욕주식거래소’에서 주가가 대폭락한 데서 발단된 공황은 가장 전형적인 세계공황으로서 1933년 말까지 거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이 여기에 말려들었으며, 여파는 1939년까지 이어졌다. 이 공황은 파급범위·지속기간·격심한 점 등에서 그 때까지의 어떤 공황보다도 두드러진 것으로 대공황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것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배후에는 만성적 과잉생산과 실업자의 항상적(恒常的)인 존재가 현재화(顯在化)되고 있었다. 이런 배경 때문에 10월의 주가 대폭락은 경제적 연쇄를 통하여 각 부문에 급속도로 파급되어, 체화(滯貨)의 격증, 제반 물가의 폭락, 생산의 축소, 경제활동의 마비상태를 야기시켰다. 기업도산이 속출하여 실업자가 늘어나, 33년에는 그 수가 전 근로자의 약 30 %에 해당하는 1,500만 명 이상에 달하였다.
이 공황은 다시 미국으로부터 독일·영국·프랑스 등 유럽 제국으로 파급되었다. 자본주의 각국의 공업생산고는 이 공황의 과정에서 대폭 하락하고 1932년의 미국의 공업생산고는 1929년 공황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44 % 저락하여 대략 1908∼1909년의 수준으로 후퇴하였다. 또한 이 공황은 공업공황으로서 공업부문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에도 영향을 미쳐서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남아메리카에서 농산물 가격의 폭락, 체화의 격증을 초래하여 각 지방에서 소맥·커피·가축 등이 대량으로 파기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금융부문에서도 31년 오스트리아의 은행 도산을 계기로 유럽 제국에 금융공황이 발생하여, 영국이 1931년 9월 금본위제를 정지하자 그것이 각 국에 파급되어 금본위제로부터의 잇따른 이탈을 초래, 미국도 33년 금본위제를 정지하였다.
이 공황은 자본주의 각국 경제의 공황으로부터의 자동적 회복력(自動的回復力)을 빼앗아감으로써 1930년대를 통하여 불황을 만성화시켰으며, 미국은 뉴딜정책 등 불황극복정책에 의존해야 하였다. 10여 년 동안의 대불황에 허덕인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경기를 회복, 대전 중에는 실질소득이 거의 2배로 증가하였다.
Ⅳ. 뉴딜정책의 출현
1. 뉴딜정책의 탄생과정
1933년 3월 4일 32대 대통령에 취임한 루즈벨트는 취임연설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두렵다는 마음 그 자체이다. 즉 퇴보를 전진으로 돌리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마비시키는 막연한 그리고 이치에 맞지 않는 부당한 공포감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여 공황에 치진 국민에게 장래를 희망을 가지고 바라다볼 것을 다짐하고 이 나라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고 그 행동은 곧 취해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여 공황타개에 대한 그의 소신을 즉각 정책으로 옮기리라는 것을 엄숙히 맹세하였으며 지금 이 악몽의 순간에서는 전통적인 정책보다는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복구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실 뉴딜정책은 정부가 어느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폈다기보다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일련의 새로운 정책을 폈던 것이다.
과연 그는 신속 과감하게 행동하였다. 즉 3월 9일 긴급은행법으로부터 시작하여 6월 16일 전국산업복흥법으로 끝나는 133일 동안에 국회에 10여차례 걸쳐 교서를 보내고 15개의 중요법안을 통과시켜 ‘뉴딜’의 골격을 국민 앞에 내놓았다. 한편 백악관에 마이크를 설치하여 노변담화(Fire Chat)를 전국의 방송국을 통해 알리면서 뉴딜에 대한 지지를 전국민에 호소하였다. 보통 ‘100일간’(The Hundred Days) 이라고 말해지는 이 기간에 세워진 뉴딜은 복흥(Recovery)·구제(Relief)·개혁(Reform) 을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3R의 정책이라고도 한다.
뉴딜정책은 제1차 뉴딜기(1933~34)와 제2차 뉴딜기(1934~1936)에 그 성격과 성과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자는 긴급적·구호적 성격이 농후하고 일시적 성과가 있었지만, 후자는 제도적·개혁적 성격과 항구적 복지사회정책의 성과가 컸던 것이다.
2. 뉴딜정책의 결과
1) 재정적자와 과세정책
뉴딜정책을 통하여 정부가 경제부흥, 빈민구호, 경제적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것은 정부지출, 즉 공공지출(PUBLIC SPENDING)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적으로 공통이 되는 추세였다. 연방정부의 지출이 늘고 예산상의 적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공황직후 후버 행정부에서부터였다. 루즈벨트가 대통령 취임당시 연방채무가 무려 210억달러나 되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실업자에게 소득을 줄 수 있는 적자라면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1937년과 1938년의 경기침체 현상으로 정부의 예산정책에 책임을 돌렸는데 루즈벨트 행정부는 적자재정을 통해 소득분배의 문제에 접근하려 하였다. 이는 5만달러 이상의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에 누진율 적용, 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75%까지 올려서, 누진율의 상속세 부과하는 것 이였다. 그러나 세제개혁도 소득구조를 바꾸기에는 불충분하였다. 뉴딜의 다른 정책들과 더불어 정부가 국가경제와 국민복지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관념을 구체화하기 시작.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대신에 간섭자본주의가 출현할 기회를 열어놓았다.
2) 2차대전과 뉴딜의 종결
1938년 마지막 뉴딜입법 추진하였다. 신농업 조정법을 실시하여 농산물 가격을 지원, 농토보존을 위한 지불을 계속하였다. 정부의 막대한 손해를 헨리 윌리스의 곡가고정유지안을 시해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의 손해나 비용을 합리화시켜서 곡물보험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러던 중 2차대전이 일어났고 1938년에는 공정노동기준법이 제정되었다. 2차대전과 함께 뉴딜정책도 종결되고 말았다. 경기회복을 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직면한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2차대전 후 국민들을 적응시키지도 못했다는 오점을 남겼다.
3. 뉴딜정책의 역사적 의미
뉴딜은 전진이 정지되었다. 그러나 사라지지는 않았다. 국민의 생활비를 보조하고 경제생활을 규제하는 복지자본주의는 여전히 유지되어 60년 후의 오늘날에도 미국국내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노동자보호조항, 서민을 위한 주택건설과 같은 복지정책들은 확장되고 새로운 사업계획으로 보강. 미국 경제에서 최대의 성공을 거둔 부문인 뉴딜의 농업지원정책은 가격조정제도와 생산 제한제 밑에서 여전히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1930년대를 꿰뚫는 한 가지 문제, 즉 경제성장에 대한 요구의 테두리에서 본다면 뉴딜은 단기적인 견지에서 실패작임. 그렇지만 장기적인 견지에서는 성공으로 이끈 여러 변화를 일으켜 놓았다. 뉴딜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제약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말해 미국정치제도의 보존과 그의 장벽, 루즈벨트의 지적 한계성, 무엇보다도 미국 유권자들의 경제적 무지와 철학적 미숙 같은 것을 이해해야 한다. 뉴딜은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개선하였다. 또한 그것은 많은 문제를은폐하고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정치제도가 위기를 당해서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의 전부이다.
4. 뉴딜정책과 미국의 경기회복
미국의 경우 대공황으로부터의 회복요인을 거시적인 유효수요확장정책에서 찾는 것이 전통이었다. 그러나 재정정책의 경우 실제 재정수지가 아닌 “완전고용흑자” 개념에서 볼 때 오히려 30년대를 통틀어 흑자재정기조가 유지되었다. 즉, 팽창적 재정정책은 “그 결과가 미미해서가 아니고 정책자체를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적인 회복방안이 되지 못하였다 (Brown 1956, p.863). 연방정부의 공공사업들은 오히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원배분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까지 나오고 있다 (Wright 1974; Anderson and Tollison 1991).
금융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대종을 이룬다. 물론 연방준비위원회가 1933년 이후에도 공개시장매입이나 재할인율인하 등을 통해 본원통화를 증가시키는데 소극적이었다는 비난이 없지 않으나 (Friedman and Schwartz 1963, pp.511-4) 1933년에서 1937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통화량 (M1)이 연평균 거의 10%씩 증가하였던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고율의 지속적 통화량증가는 1930년대초 금융공황의 여파로 통화승수가 줄어들었음을 감안하면 본원통화가 같은 기간 연율 10% 이상 증가한 데 기인한다. 연방준비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원통화가 급증한 것은 1933년 미국이 금본위제를 이탈하고 달러화를 평가절하한 이후 금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정치적 상황 때문에 유럽으로부터 자본유입이 커졌기 때문이다.
통화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명목이자율이 낮아졌다. 상업어음할인율이 1933년 한해에만 2.63%에서 1.25%로 떨어졌고 1934년 이후에는 거의 0에 가깝게 되었으며 회사채 수익률도 신용평가순위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1933-1936년간 4.5% 수준에서 3.2%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통화팽창이 이자율하락을 통하여 유효수요를 증대시킨다는 전달메카니즘을 받아들인다면 명목이자율보다 투자지출결정에 요인으로 등장하는 사전적 실질이자율을 구할 필요가 있다. 양자의 괴리는 물가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기대 때문인데 물가변동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 만족할 만큼 풀리지 않고 있다. 최근에 추계된 사전적 실질이자율은 1933년에 급격히 하락하였고 1937년까지 지속적으로 하강하여 마이너스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자율 하락은 고정자본투자와 내구소비재 수요를 자극하여 1933년부터 경기회복을 주도케하였고 기타 소비재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대는 그 이후 잇달았다. 이와 같이 유효수요증대가 재정팽창에서 온 것이라기보다 통화량증가에 의한 이자율하락에 기인한 것이었다면 전쟁의 효과도 군비지출보다는 전쟁발발전 유럽으로부터의 자본유입에 의한 통화팽창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결론도 가능하다(Romer 1992).
이제 뉴딜 정책을 살필 차례이다. 일반적으로 뉴딜의 정책들을 구호대책 (relief), 경기부양책 (recovery), 개혁조치 (reform) 라는 세 개의 범주로 나눈다. 학자들의 견해는 각양각색이지만 흔히 구호대책은 적어도 당면목표는 달성했다고 할 수 있고 개혁조치는 호불호를 떠나 장기적, 제도적 효과를 가졌으나, 경기부양책은 그다지 성공하지 못하였다고들 평가되고 있다. 우선 산업부흥법(NIRA)을 보자. 이것은 주당 35내지 4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시간당40센트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며,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고령자 및 연소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또한 아동노동을 통제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평상시면 모르겠지만 대공황기의 이와 같은 입법은 미숙련노동자의 임금을 인상시킴으로써 전반적인 임금인상의 요인만 높이고 노동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비효율적 노동자의 고용을 증대하여 노동비용만 높이게되는 결과를 낳았다. 최저임금제로 인하여 미숙련노동자의 임금이 인상되자 전반적 임금수준이 상승하여 NIRA가 위헌판결을 받기까지의 2년만에 실업율이 NIRA가 없었을 가상적 경우에 비해 무려 5%나 늘어나는 효과를 초래했다는 추계가 있다 (Weinstein 1980, ch.4). 농업부문에서도 정책실패의 예가 나타나고 있다. 농업조정법 (AAA)은 주로 과잉생산과 수요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작지 감축을 목표로 신용축소정책을 수행했던 바, 그 결과는 소작농의 임노동자화 및 농촌으로부터의 축출효과를 초래하여 산업공황을 오히려 깊게 만들었으며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사회문제를 노정시킨 면이 크다는 것이다 (Whatley 1983).
미국의 뉴딜정책을 대공황탈피의 기점으로 삼는 설도 많다 (Chandler 1970, ch.8; Fearon 1987, Part 3).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정책에 대한 평가는 회의적이다. 이에 대하여 생소한, 그러나 설득력있는 논지를 펴는 학자들이 있다. 뉴딜이 대공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민간기대를 반전시키는 “체제적 변화(regime change)”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정책수단들의 일관성부족에도 불구하고, 뉴딜정책은 기업가들의 신뢰를 되살렸고, 투자지출의 증대를 끌어냈다 (Temin and Wigmore 1990). 아울러 뉴딜정책은 정부의 예산규모를 확대시키고, 주정부, 지방정부에 비해 연방정부의 비중을 증대하였다. 대공황에 대한 긴급대책으로 정부지출이 폭발적으로 팽창하였고, 뉴딜 이후 국민총생산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20년대에 약 12%이던 것이 뉴딜 기간에 20% 이상으로 증대되었다. Wallis 1985). 정부가 경제 및 사회의 안정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고방식이 자리를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영국의 경기회복을 설명하는 가설들은 다양하다. 1931년 금본위이탈과 파운드화의 평가절하, 신용팽창에 따른 이자율 하락과 투자증가, 1932년의 일반관세도입과 장기자본수출의 규제, 투자수익률에 대한 기업가들의 낙관적 기대, 주택건설호황, 직물, 철강, 조선 등 구산업의 침체와 대비되는 전기, 화학, 자동차 등 신산업의 급속성장, 그리고 193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군비지출 등등이 경기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꼽히고 있다 (Winch 1969; Alford 1972).
거시정책부터 살펴보자. 맥밀란위원회 (Macmillan Committee of Finance and Industry)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케인즈는 1930년에 이미 유효수요진작을 위해 공공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재무성을 지배하던 균형재정의 원칙에 따라 적자재정에 의한 정부지출증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재정지출은 보정적이 아니라 순순환적 (pro-cyclical)인 움직임을 보였다. 또한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재정규모 자체도 1935년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재정정책은 경기회복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Richardson 1967). “불변고용재정구조”의 개념으로 보면 대공황 발발후 1933-34년까지 흑자가 가속적으로 누적되었으며 그 이후 재정긴축도가 낮아지기 시작하여 재무장전비지출이 급증할 때에야 적자재정으로 돌아섰다 (Middleton 1981). 그러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자재정을 통한 공공사업을 실시할 경우 당시 300만명이 넘는 실업자들을 고용할만한 유효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투자승수의 값을 낙관적으로 크게 잡는다 하더라도 공채관리에 허덕이고 있던 정부로서 정치적,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정도의 대규모 재정지출 증가가 필요하였을 것이라는 추계도 발표되고 있다. 승수효과가 경기침체와 실업문제가 심한 산업이나 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났을 것인가도 회의적이다 (Glynn and Booth 1983).
맥밀란위원회에서 케인즈가 주창한 두 번째의, 그리고 채택된 경기대책은 보호무역으로서, 관세의 도입에 의해 국제수지를 호전시키고 교역조건을 높이자는 것이었다. 유효수요증대와 고용창출의 목표를 위해 1840년대 이후로 계속 견지되어왔던 자유무역주의를 포기한 영국은 1932년 거의 모든 제조업품 수입에 10%의 일반관세를 부과하였고 그 이후 상당품목에 대해 관세율인상을 단행하였다. 일반관세는 대외적으로는 기존교역상대국에서 수입하던 상품을 영연방국에서 수입하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낳았으며 기존교역대상국의 보복적 보호주의 정책을 심화시킨 면이 있는 반면 총수입액을 줄이는 효과는 컸다. 국내적으로는 영국제품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보호된 산업에서의 투자를 촉진하였다. 이는 단기적으로 유효수요를 증가시켜 승수효과에 의해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일반관세는 이하에서 곧 논의할 파운드화의 평가절하와 함께 제조업제품 수입성향을 떨어뜨렸으며 수입대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일반관세의 도입이 평가절하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주장도 돋보인다 (Kitson and Solomou 1991, ch.4). 일반관세는 또한 보호율이 낮은 산업부문에서 높은 부문으로 자원을 재배분하는 효과를 갖는다. “실효보호율”을 계산한 연구들은 직물, 자동차, 화학, 비철금속, 우리제품 등이 보호를 많이 받았고 철강, 조선, 판유리, 전기 등은 비교적 보호를 못받은 산업이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Ⅴ. 뉴딜정책의 영향
1. 농업정책적 측면
루즈벨트가 착수하였던 1933~34년까지의 소위 제1차 뉴딜은 주로 경기회복에 주안점을 두었다. 개혁이나 즉각적 구호 같은 인본주의적 법안들은 그의 그러한 경기부활 우선주의에 부속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2차 뉴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1933년 5월에 제정된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AA)이다. AAA는 비상사태선언에서, 긴박한 경제적 비상사태의 일부분은 농업생산품과 기타 상품과의 사이의 격심하게 증대하고 있는 가격의 불균형의 결과에서 유래하는 것이며, 이 가격의 불균형은 공업생산품에 대한 농민의 구매력을 크게 파괴하며, 상품의 정상적인 교환을 붕괴하고 국민적 공적 이익을 가지는 농업상품의 교역을 저해하고 정상적 상업교류에 큰 짐을 지우고 방해를 주기 때문에 본법의 즉각적인 제정이 절대로 필요하다. 고 선언하였고 또한 그 정책선언에서 농업자들이, 구매코자 하는 상품에 관하여 기준년도에 있어서의 농업상품의 구매력과 동등한 구매력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수준에까지 가격을 다시 상승시킬 수 있도록 농업상품의 생산과 소비와의 사이의 균형 및 시장조건을 설정하여 이를 유지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실현을 위해 AAA는 NIRA보다도 더 명확한 생산제한 원리에 기반을 두게 되었다.
이 AAA는 제1차 뉴딜정책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농부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산을 자발적으로 줄이면서 농산물 가격을 복구시키는 것이었다. 그 목표는 농산물 생산을 제한시킴으로써 농산물 가격을 농부들의 황금시기였던 1909년부터 1914년 사이의 농산물 가격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농부들로 하여금 농경지를 줄이도록 하고 이과정에서 농부들이 입은 손해는 정부가 보상해 주었다. 1933년 10월에는 19세기말 농민 연합이나 인민주의자들이 주장하였던 농촌신용대부법(Farm Credit Act)과 같은 정부 주도형 농촌부흥정책을 폄으로써 농촌 및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였다. AAA는 초반에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환영받았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을 때 정부가 농산물 생산을 의도적으로 줄인다고 해서 곧 심한 비난을 받게 되고, 1936년에는 대법원에 의하여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뉴딜정책은 단기적 긴급 구제정책은 성과를 보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남겨 두게 되었다. 농산물 가격인상과 구매력 증대의 목적은 부분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미국의 농업을 대공황의 심원으로부터 번영으로 완전히 전환시키지는 못했다. 1941년에 가서야 전시체제로의 전환으로 비로소 1929년의 농업소득수준을 초과하게 되었다. 또 기계류를 포함한 농업장비와 공업상품의 가격상승은 농민소득의 상당한 부분을 덜어갔기 때문에 AAA의 효과는 그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NIRA의 공업제품 가격상승정책은 농가구매력 상승정책과 충돌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능률적인 자영농민과 자립적인 농업경제의 확립을 목표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통제에 의하여 농산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을 동시에 추진한 것으로써 처음부터 정책상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었다.
뉴딜농업정책은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상당한 성과도 있어 공황극복과 경제회복 그리고 농업개혁정책 전환에 기여한 바 적지 않다. 그러나 실험주의적 입장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정책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시행착오와 미흡한 점이 적이 않았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뉴딜농업통제의 방향은 근본적으로 옳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 후 결함을 수정 보완하여 미국의 항구적인 농업정책으로 발전시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2. 산업정책적 측면
AAA와 함께 제1차 뉴딜정책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전국산업복흥법(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NIRA)이었다. 이것은 1933년 6월에 국회의 인준을 받아 공공사업청(Public Work Administration, PWA)과 국가복흥청(National Recovery Administration, NRA)을 설치하였다. PWA는 도로, 공공건물, 공원, 학교 등과 같은 공공건물 시설을 건설함으로써 고용을 늘려 결국에는 소비를 늘이도록 하는 데 주목적이 있었다. PWA정책에 따라 미국 도시에 많은 공원, 학교, 동물원 등의 공공시설들이 건설되었다. 이에 따라 그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NRA의 목표는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동시에 이득이 갈 수 있게끔 정책을 촉진시키려는 것으로 정부가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여 산업체들간의 공정한 활동을 보장하려고 하였다. 이들 정책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NRA의 상징인 청색독수리가 찍힌 마크를 찍어주고 국민들은 이 마크가 찍힌 상표만 사도록 격려하였다. 처음에 이것은 예상외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 성공하였으나 경기가 조금씩 부흥하자 대기업체는 다시금 독점욕을 발동하기 시작하였고 중소기업체는 갈수록 경쟁에서 밀려나 NRA의 규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1935년에 대법원은 NRA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NIRA에 의한 산업정책이 지니는 경제사적인 의의를 살펴볼 때 당초에 기대했던 만큼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미국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정부가 이를 방관하지 않고 그것을 구출하려 노력하였고, 혁신주의시대의경험을 계승하면서 자유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대폭 수정하여 산업에 대한 통제적 경제정책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1933년에 시작된 테네시 계곡 개발 공사(Tennessee Valley Authority, TVA)는 루즈벨트의 뉴딜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것은 테네시와 그 주위 7개 주에 걸쳐 있는 강에 댐을 건설하여 질산 비료와 값싼 전력을 공급하고, 그밖에 많은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대공사였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테네시 계곡의 댐 공사로 인하여 그곳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값싼 전력을 공급하고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중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정부의 대규모 공사에 의하여 주민들은 어느 정도 돈을 그들의 호주머니에 넣게 되었고, 또한 이것을 소비함으로써 그동안 수요가 공급을 따르지 못하였던 경제적 악순환을 회복시킬 수 있었다. 정부는 소비의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세금으로 더 많은 공사를 촉진하면서 경제의 폭을 늘여갈 수가 있었다. TVA공사는 정부가 지방의 협조를 얻어 대대적인 공사를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시켜주는 좋은 관례를 남겨 놓았다. 무엇보다도 지역개발은 각 지방이나 주의 담당 아래 있다는 그동안의 오랜 개념을 깨뜨리고 이젠 중앙정부가 지역 개발까지 주도해서 시행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주었다.
3. 노동법적 측면
미국노동법제사상 최고봉을 이루고 있고 김자탑과 같은 존재로 볼 수 있는 법규는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 or Wagner Act) 이라 하겠다. 제1차뉴딜정책기에 있어서의 NIRA 제7조 a항에 의해 노동세력이 상당히 신장되었지만 제2차 뉴딜정책기에 있어서는 전국노동관계법에 의해 노동세력이 획기적으로 팽창하였고 미국노동사회·경제사회·정치사회에 미친 영향은 실로 중대하였다. 이 법은 노동자들이 그들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을 통하여 고용주와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였으며 고용주는 노동조합 활동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다섯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조직하여 노동자들의 교섭을 후원하고 고용주들이 불법적인 해고 등, 부당하게 처우했을 경우 이것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뉴딜노동정책의 목적이 단순히 노동자들의 권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자본주의경제 전체를 회복하기 위한 경제적 목적에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노동문제에 적극 관여하여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육성하여, 노자간의 동등한 세력으로 향상시켜 대등한 위치에서 성의있는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더 좋은 노동조건과 더 많은 임금을 획득케 하여 노동계급의 생활력과 경제력을 배양·향상시켜 상품에 대한 구매력을 증대시키고 더 많은 유효수요를 창출케 함으로써 경제회복을 촉진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뉴딜노동정책의 근본정신은 노자간의 단체교섭권과 균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과 사회정의를 구현하여 ‘소수자가 다수자를 지배한다’는 폐단을 수정하고 부와 소득의 부당한 집중을 방지하여 ‘재산권이 인권을 유린한다’는 비인간적·비민주적 현상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와그너법의 불당로동행위제도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제1차 뉴딜기의 노동정책은긴급적 일시적 성격이 농후했지만 제2차 뉴딜기에 들어와서는 기본적 항구적인 중요한 국가경제정책으로 취급되었던 것이며 미국의 자본주의경제사회로 종전보다 훨씬 안정되고 건전한 복지국가로 발전하여 전국민적 요망을 충족하게 되었다.
4. 정치적 측면
공황의 암담한 계곡을 통과하면서, 미국인들은 그들의 경제관 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들은 또한 정치적 성향마저 수정한 것이다. 국민의 정치사상에서 일어난 가장 놀라운 변환은 루즈벨트혁명이었다. 그것은 민주당을 미국의 정치생활에서 지배적인 위치로 끌어올린 일이었다. 아마도 정치적 변혁 가운데 가장 예기하지 못했던 결과는 3세대 동안 공화당을 지지해 왔던 흑인표가 민주당으로 옮아간 것이다. 20세기에 있어서 그 밖의 다른 많은 변화가 아울러 흑인들의 투표 관례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산업화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노예제 폐지 이래 거의 반세기 동안 흑인 인구의 약90%가 남부에 살고 있었다. 1차대전 동안 북부의 공업이 팽창됨에 따라 숙련 노동과 미숙련 노동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의 다수가 북부산업에서의 새로운 기회에 이끌려 남부를 떠났다. 흑인이 남부로 이동하는 가운데 두가지 뚜렷한 사회적 정치적 특질을 상실하였다. 남부의 흑인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였고 수정헌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선거권이 박탈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단 북부로 오게 되자 흑인은 주로 도시의 거주자가 되었고 또한 투표권의 행사가 허용되었다. 물론 흑인의 새로운 도시환경은 그들을 북부로 이끌어들인 산업에 의하여 조성되었다. 이러한 흑인의 선거권과 도시집중의 사태는 북부에서 처음으로 흑인표의 강대한 영향력을 만들어냈다.
공황이 진행되면서 흑인 지도자들 중에는 후버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었지만, 흑인유권자들은 공화당에 대한 지지를 고집했다. 1932년에 흑인에게는 프랭클린 루즈벨트란 이름이 아무런 매력도 주지를 못하였다. 그러나 1936년에 이르러 변화가 일어났다. 이 선거에서 시카고의 흑인 지구는 루즈벨트에게 49%의 지지표를 던졌다. 그리고 클리블랜드시의 흑인들은 62%가 루즈벨트를 지지했다.
이 같은 극적역전의 해답은 루즈벨트 행정부의 흑인에 대한 인정이었다고 하겠다. 처음부터 워싱턴의 민주당 행정부는 흑인을 등용하였다. 공화당은 흑인을 정치적으로 임명하는데 이용해 왔으나, 민주당 행정부는 비정치적인 흑인에게 관직을 부여하고 자문을 구하였다. 흑인을 위한 여가선용센터, 병원, 그리고 학교가 연방정부의 자금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흑인들이 공화당에 대한 지지로부터 전향하게 된 모든 계기를 민주당 행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만 귀결시켜서는 안 된다. 객관적인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흑인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다양한 직종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공황의 충격 아래에서 흑인을 기꺼이 고용하려고 한 사람도 있었다. 이와 같이 흑인의 지위가 놀랍도록 개선됨으로써 그것은 집권당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크게 도움을 주게 되었다.
Ⅵ. 나가며
1929년 10월 뉴욕 주식시장의 붕괴를 계기로 일어났던 대공황은 미국 자본주의 체제뿐만 아니라 세계자본주의체제를 새로운 형태로 이행시키는 대 사건이자 역사적인 분수령이기도 했다. 그것은 우선 자본주의세계경제체제가 탄생된 이래 결코 관찰할 수 없었던 정도로 그 경기변동의 폭이 깊고 파장이 길었으며, 시장기능의 실패현상이 어느 일부 지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자본주의의 중심부/주변부 그리고 자본주의의 외부경제영역까지도 총망라하는 형태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시장기능의 실패는 자율적인 상품교환활동 및 자본의 재생산활동 자체를 단순히 왜곡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마비시킬 정도였다. 그것은 공황이 최고도로 달한 1933년경의 구체적인 경제지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의 공업생산이 평균 1929년 수준의 70% 수준밖에 안되고, 도매물가의 하락율이 거의 평균 30% 수준이며 실업율도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일본 등의 25% 수준과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30%-35% 수준에 이르는데서 잘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당시 세계 인류의 대부분을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적 측면이 아닌 순수한 경제적 측면에서 고통속에 신음하게 만들었던 대공황은 왜 일어났는가'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 1920년대에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가 유래없이 누렸던 호황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자유시장경제체의 한계를 보여줄 수 밖에 없는 '상대적 안정기'였던가(J.M.Keynes 및 사회주의경제학자들의 주장), 아니면 왈러스타인의 주장대로 세계체제로서의 자본주의체제가 '외부적'팽창의 한계에 이르고 '내부적' 팽창 또한 의심될 수 밖에 없음으로써 특수한 장기적 상향추세속에서의 '정체'상황을 보여주는 시기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 또는 그 당시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 및 실증경제사가들의 생각대로 전후의 '번영기'로 봐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로 인해 자본주의체제는 어떻게 변모하게 되는가' 이에 대한 진정한 답변은 20세기 전반기 미국 자본주의의 변화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세계자본주의를 영도하는 중심부로서의 영국경제는 케인즈의 말대로 금융투기 및 저축행위의 만연으로 인한 동맥경화증 상태에 빠져 전후의 호황기에도 여전히 장기 침체상태에 빠져 있음으로써 '팍스-브리태니카'(Pax-Britanica) 체제 자체가 이미 동요되고, 대신 미국 자본주의가 주도권을 행하는 '팍스-아메리카나'(Pax-Americana)체제의 태동이 싹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대공황의 진원지는 미국이었으며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에서 '대량생산-대량소비'라는 포디즘적 자본축적체제(Regim of Fodismic Capital Accumulation)가 전형적으로 등장하고 '자유시장경제'로부터 '관리경제'로의 이행이 뉴딜정책을 통하여 일찌기 대표적으로 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